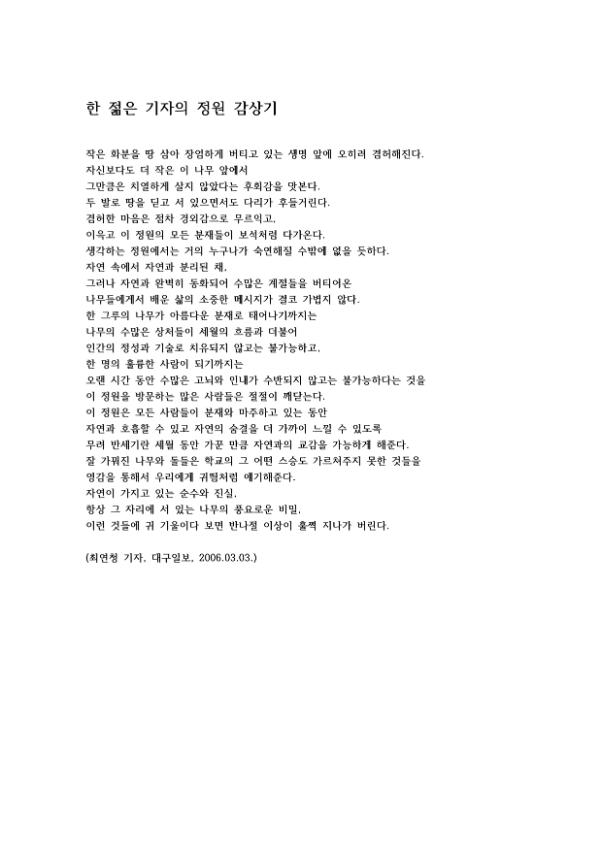한 젊은 기자의 정원 감상기
작은 화분을 땅 삼아 장엄하게 버티고 있는 생명 앞에 오히려 겸허해진다.
자신보다도 더 작은 이 나무 앞에서
그만큼은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는 후회감을 맛본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겸허한 마음은 점차 경외감으로 무르익고,
이윽고 이 정원의 모든 분재들이 보석처럼 다가온다.
생각하는 정원에서는 거의 누구나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분리된 채,
그러나 자연과 완벽히 동화되어 수많은 계절들을 버티어온
나무들에게서 배운 삶의 소중한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름다운 분재로 태어나기까지는
나무의 수많은 상처들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인간의 정성과 기술로 치유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고뇌와 인내가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정원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절절이 깨닫는다.
이 정원은 모든 사람들이 분재와 마주하고 있는 동안
자연과 호흡할 수 있고 자연의 숨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무려 반세기란 세월 동안 가꾼 만큼 자연과의 교감을 가능하게 해준다.
잘 가꿔진 나무와 돌들은 학교의 그 어떤 스승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을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띔처럼 얘기해준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수와 진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의 풍요로운 비밀,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다 보면 반나절 이상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최연청 기자, 대구일보,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