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문익환_<보존연구실 601호>
수해기록 분리: 물과 종이 사이 (2025년 9월호)
물에 불어 붙어버린 늦봄의 편지
35년 만에 ‘뚝 끊긴’ 사연의 복원
안녕하세요. 기록이 더 나은 상태로 남아주도록 궁리하는 보존연구실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록은 물에 젖어서 딱 붙어버린 종이 뭉치입니다. 습기로 우글쭈글 종이가 우는 건 그렇다 치고 뒷면이 완전히 들러붙어 편지 앞면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국가기록원 지원사업으로 보존처리를 거친 결과, 종이가 분리되어 반듯한 모양을 되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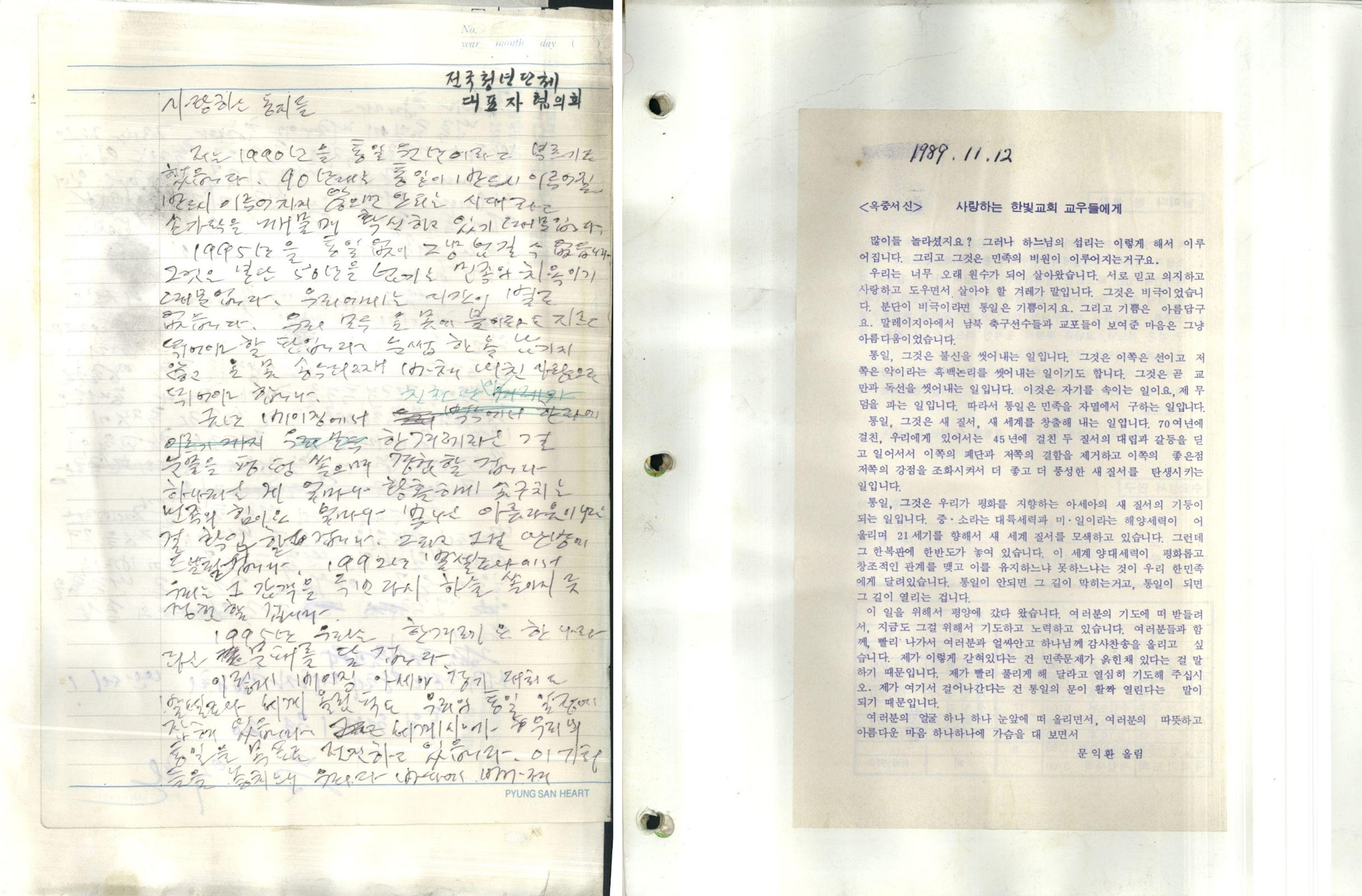
◇물에 젖어 울고 붙어버린 여러 겹의 종이 앞면(왼쪽, 편지)과 뒷면(오른쪽, 한빛교회 주보)
드러난 뒷면에는 ‘전국 청년단체 대표자 협의회 만세!’
가려진 내용 중 더 궁금한 쪽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동지들’로 시작해 중간에 뚝 끊겨버린 문익환 목사의 편지겠지요. 전국청년대표자협의회(약칭 전청협, 전청대협)라고 쓴 박용길 장로의 메모가 있어 받는 이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앞면에서는 1990년을 ‘통일 원년’이라고 선언하며, 통일에 미친 사랑으로 뛰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드러난 뒷면에서는 통일, 민주화, 민족 자주를 하나의 목표로 보고, 세 가지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지막에 ‘전국 청년단체 대표자 협의회 만세!’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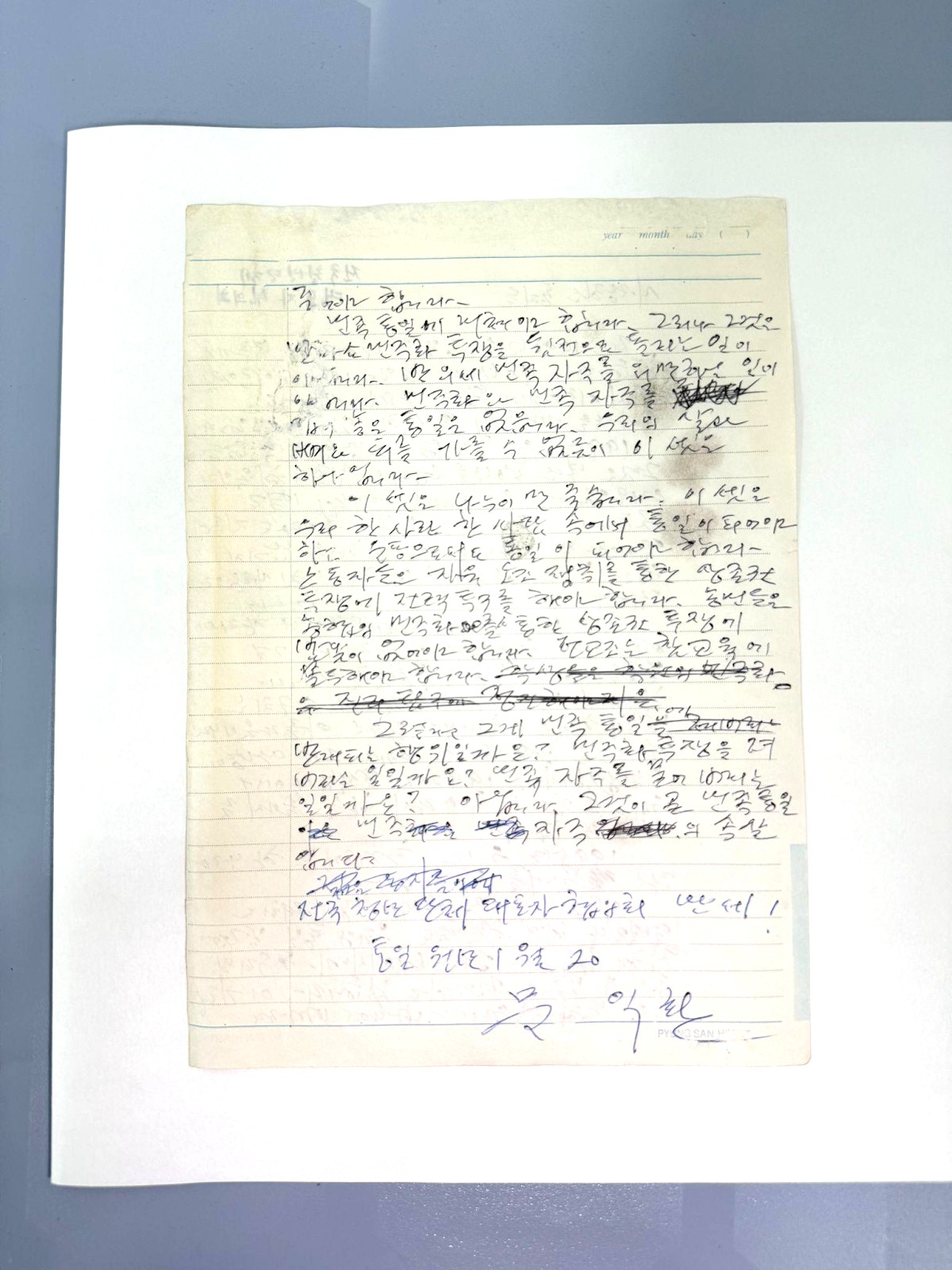
◇수해로 붙은 종이를 떼어내니 마침내 드러난 편지의 나머지 내용
병원 입원 중 병상에서 보낸 편지
날짜는 1990년 1월 20일. 전년도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일로 다섯 번째 옥살이를 하던 시기입니다. 옥중편지인데 왜 규정에 따라 봉함엽서(접어서 내용을 가리고 봉투도 되는 편지지)에 쓰지 않고 일반 공책에 썼을까요?같은 시기 박용길의 편지를 아카이브에서 검색해 보니, 일기처럼 매일 적어 보내던 편지가 열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편지 분석도 어느덧 수년째. 이 커플은 ‘같이 지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과거 데이터에 근거해, 편지 공백기에 부부가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기록을 뒤져보니 역시나,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문 목사는 심혈관 질환 검사차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20일은 전청협 1주년 기념대회에서 박용길 장로가 규탄연설을 맡기로 한 날인데 편지 날짜와 수신인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문 목사가 병상에서 전청협 1주년을 축하하고 모인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글을 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청년대표자협의회는 1989년 결성된 14개 민주화운동 청년단체의 연대 조직입니다. 2년 뒤에는 더 크고 강하게 결속하여 42개 진보 청년단체가 참여한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협)’로 발전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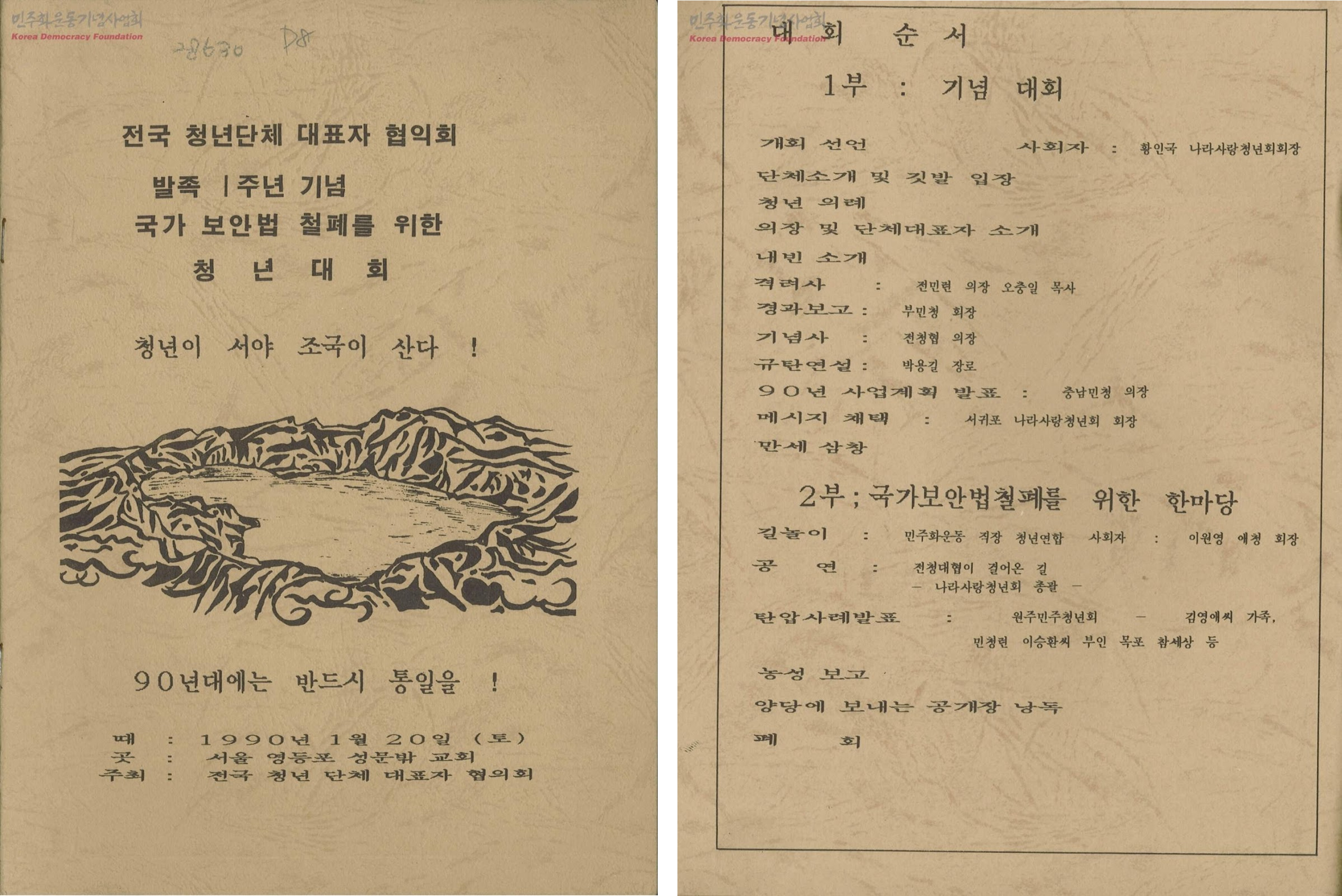
◇전청협 1주년 기념 청년대회 행사 책자 표지(좌)와 박용길의 규탄연설이 포함된 식순(우)

최근 저력 보여준 청년들의 연대
요즘 청년들은 SNS로 관계맺고 해시태그로 연결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합니다. 한 이념과 목적을 갖고 전국적으로 움직인 30년 전 거대조직의 단결력과 진지함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이래, 청년들은 ‘느슨한 연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종이 사이의 물처럼 말이지요.해체와 연결을 오가는 물
종이를 이루는 셀룰로오스 섬유는 물에 닿으면 섬유 간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주변의 다른 종이 섬유와 뒤엉깁니다. 마르면 수축하면서 얽힌 채 고정돼버리죠. 이 상태에서 억지로 떼어내면 종이는 찢어지고 글자는 지워집니다. 그런데 다시 물이 닿으면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이 약해지고 섬유가 유연해져, 붙었던 종이가 부드럽게 떨어져 나옵니다.훼손과 복원 과정을 짚어보니 기록물을 붙인 것도, 떨어뜨린 것도 물이었습니다. 해체와 연결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물. 틈 사이사이를 메우고 굳은 것을 풀어주는 물은 훼손된 기록뿐 아니라 경직된 사회와 인간관계 사이에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물길과 보존가의 손길을 거쳐 복원된 수침피해 기록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 주세요!
<글: 박에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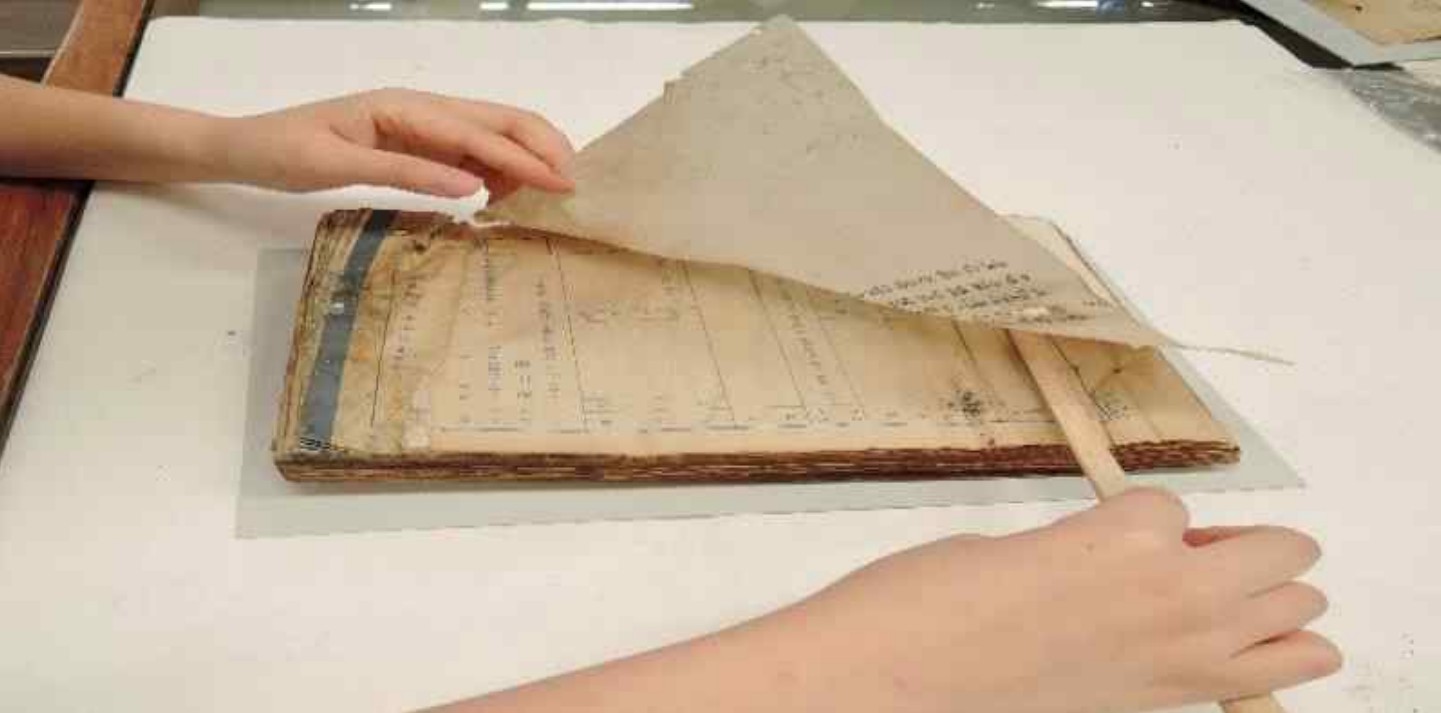
◇나무로 된 구두주걱으로 수침 기록물 낱장을 분리하는 모습(국가기록원 재난피해기록물 응급조치 매뉴얼, 2022)
월간 문익환_<보존연구실 6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