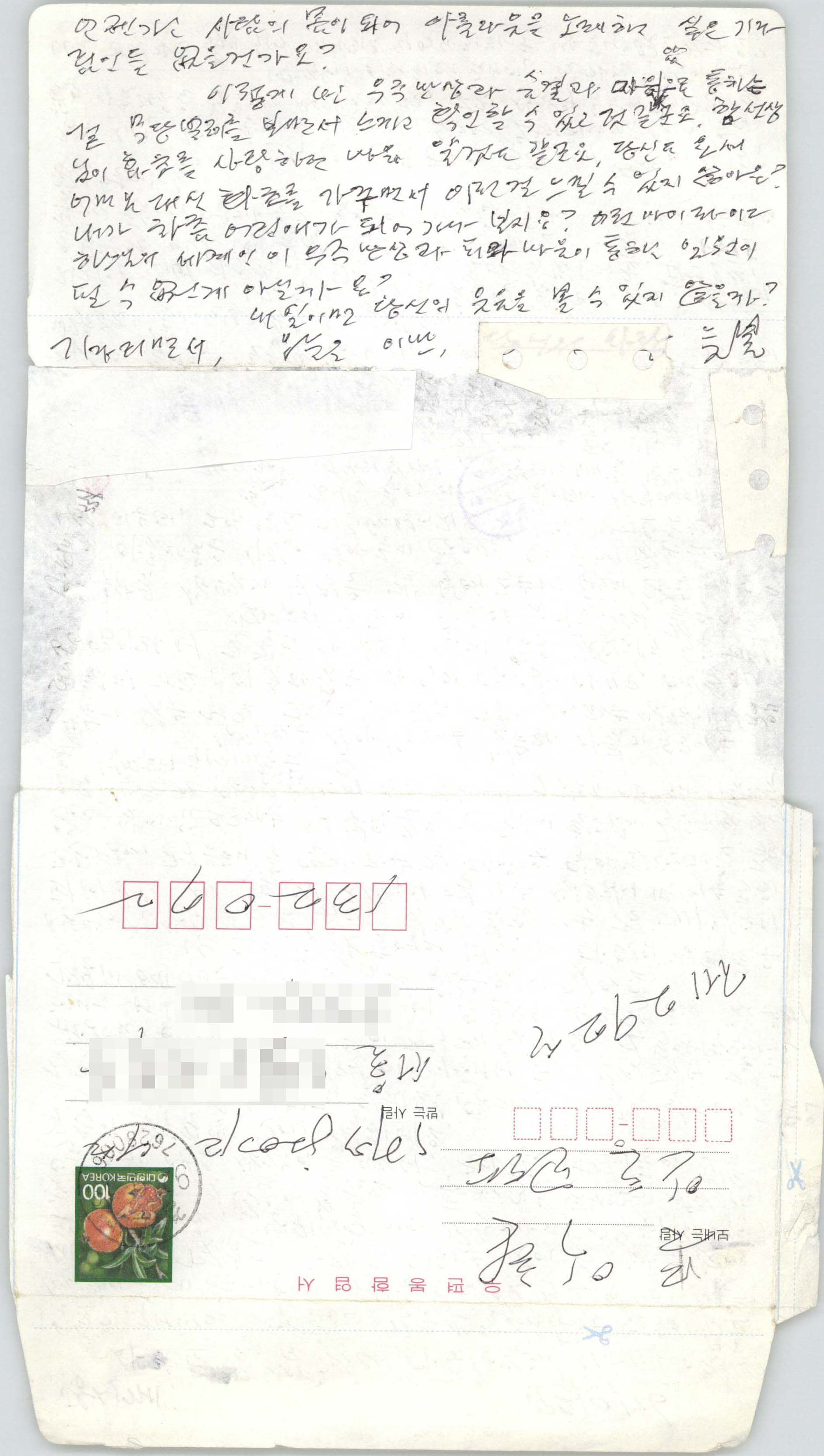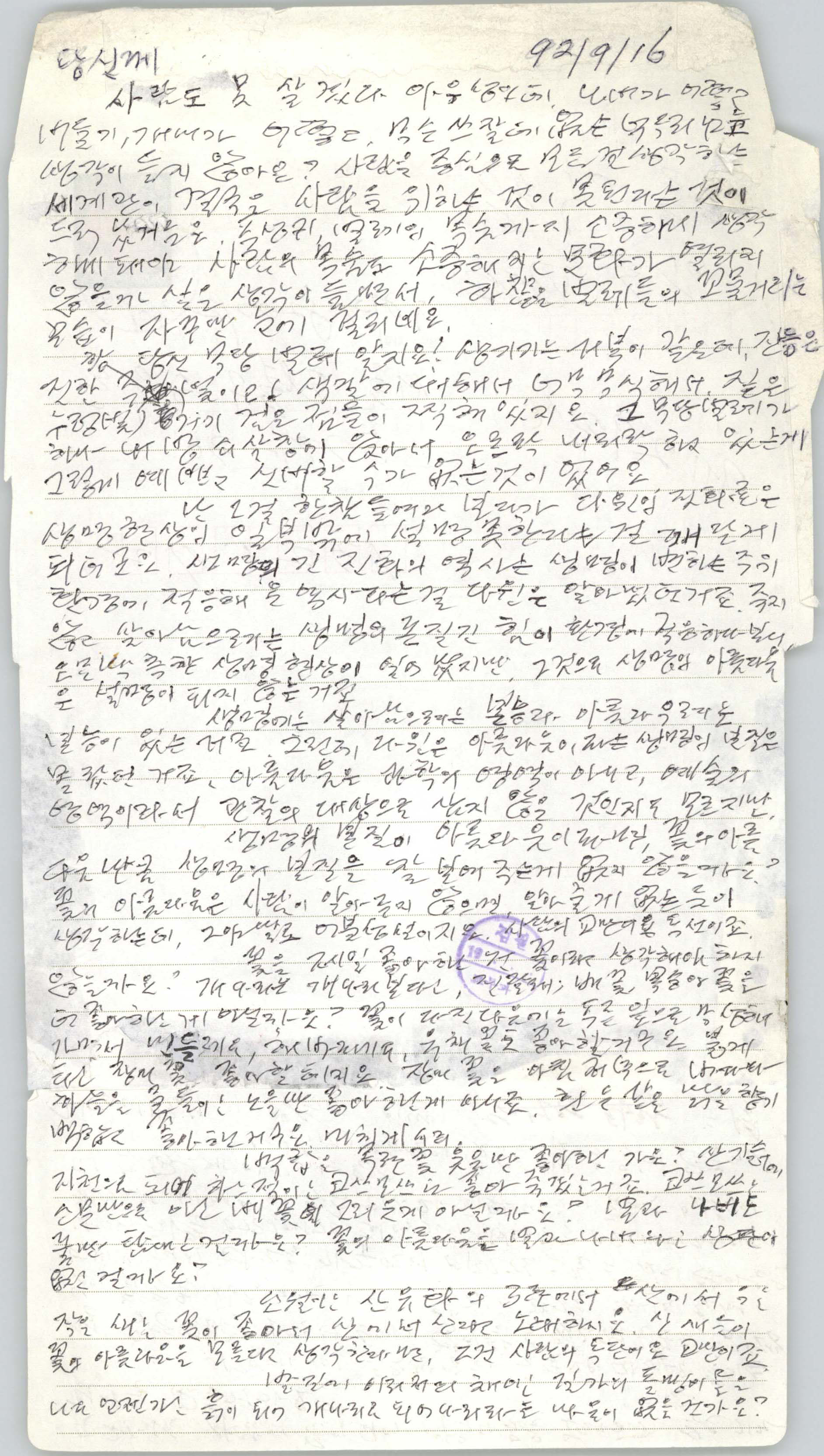생명의 두 가지 본능
당신께
사람도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나비가 어떻고 비둘기, 개미가 어떻고, 무슨 쓸데없는 넋두리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세계관이 결국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푸성귀, 벌레의 목숨까지 소중히 생각하게 돼야 사람의 목숨도 소중해지는 문화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하찮은 벌레들의 꼬물거리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걸리네요.
당신, 무당벌레 알지요? 생기기는 거북이 같은데, 등은 진한 주황빛이고 (색깔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서, 짙은 누런빛) 거기 검은 점들이 찍혀 있지요. 그 무당벌레 하나가 내 방 쇠창살에 앉아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게 그렇게 예쁘고 신비할 수가 없어요.
난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윈의 진화론은 생명 현상의 일부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생명의 긴 진화의 역사는 생명이 변하는 주위 환경에 적응해 온 역사라는 걸 다윈은 알아냈죠.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끈질긴 힘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오묘 막칙한 생명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은 설명이 되지 않죠.
생명에는 살아남으려는 본능과 아름다워지려는 본능이 있죠. 그런데 다윈은 아름다움이라는 생명의 본질은 몰랐어요. 아름다움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이라서 관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생명의 본질이 아름다움이라면, 꽃의 아름다움만큼 생명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게 없지 않을까요? 꽃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줄 게 없는 듯이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지요. 사람의 교만이요 독선이죠.
꽃을 제일 좋아하는 건 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나리는 개나리보다는 진달래, 배꽃, 복숭아꽃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꽃이 다 진 다음에는 푸른 잎으로 무성해 가면서 민들레도, 해바라기도, 유채꽃도 좋아할 거고요. 붉게 타는 장미꽃도 좋아할 테지요. 장미꽃은 아침저녁으로 바다와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흰 눈 같은 맑은 향기, 백합도 좋아할 거고요. 미치게시리. 백합은 목련꽃 웃음을 좋아하고 가을 산기슭에 지천으로 피어 하느작거리는 코스모스도 좋아 죽죠. 코스모스는 소문만으로 아는 배꽃이 그리운 게 아닐까요? 벌과 나비는 꿀만 탐내는 걸까요? 꽃의 아름다움은 벌과 나비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소월은 「산유화」의 3연에서,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고 노래하지요. 산새들이 꽃의 아름다움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건 사람의 독단이요 교만이죠. 발길에 이리저리 채이는 길가의 돌멩이들은 나도 언젠가는 흙이 되어 개나리로 피어나리라는 마음이 없을까요? 언젠가는 사람의 몸이 되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싶은 기다림인들 없을까요?
이렇게 나는 우주 만상과 숨결과 마음으로 통하는 걸 무당벌레를 보면서 느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함 선생님이 화초를 사랑하던 마음, 알 것도 같군요. 당신도 요새 어머님 대신 화초를 가꾸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차츰 어린애가 되어 가나 보지요? 어린아이라야 하느님의 세계인 이 우주 만상과 피와 마음이 통하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내일이면 당신의 웃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만. 늦봄
1992.09.16
※ 이 편지는 ‘살림’ 11월호에 실렸다(아카이브 주)